조선일보를 읽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난다.
조선일보는 대개 논조가 정연하다. 자기 지평에서 논리적으로 트집 잡을 게 별로 없다. 어떤 뉴스의 핵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의 언저리를 가장 정통하게 꿰고 있는 신문 또한 조선일보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있으면 성이 차지 않고, 해서 때로는 짜증이 난다. (여기서의 '조선일보'는 내가 아는 조선일보다. 다시말해 80년대의 조선일보다. 난 아무개씨가 주필을 맡고 있던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바가지로 욕을 하고 거기와 연을 끊은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 구인광고 건으로 광고면은 둬 번 본 적이 있다 -- 어쨌거나 현재의 조선일보에 관한 한 난 할 말이 없음을 밝혀 둔다.)
왜 그럴까? 왜 조선일보를 읽으면 성이 차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혹시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저 박식함 때문인 건 아닐까.
조선일보에는 한겨레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치기'가 보이지 않는다(여기서의 '한겨레신문' 역시 80년대의 한겨레신문이다). 후자에서와 같은 일방성과 논리의 비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는 듯한 저 일차원적 멘탈리티가 전자에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저 논조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가시지 않는 어떤 응어리가 가슴에 쌓인다. 저 해설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갑갑하게 여겨지는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대하면 일순 가슴이 트인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논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기엔 이 또한 망설여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서 얻게 되는 저 시원함은 '오월의 노래'나 '마아아안주~버얼판~'을 부르면서 갖게 되는 감상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카타르시스에 지나지 않는다. 결코 본질적인 의미의 정화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에 대한 이같은 인상은 혹여 그 동안의 체제 이데올로기가 길들여 놓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 또한 한겨레신문이 나를 길들인 결과일지도 또 모를 일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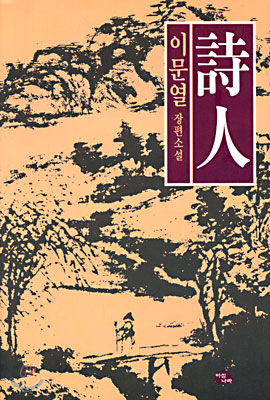
박식함은 때로 하나의 정연한 거짓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거짓이 진리보다 더한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가 항상 정합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도대체 이 지난한 현실 속에서 감히 누가 어떤 정합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던가.
그렇기에 양시양비론은 어쩌면 박심함이 져야 하는 멍에일지도 모른다. 대체 저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천 오백년 인류의 정신사가 곧 저 문제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터에, 그 대하(大河)에 잠겨 있는 어떤 정신이 있어 그 물줄기를 한 칼에 베어 갈라 세울 수 있겠더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다만 시인은, 소설가는 보여줄 따름이다.
이런 길이 있었노라고. 이런 방식으로 거기에 답해본 사람이 있었노라고.
그렇다면 시인은, 소설가는 독자가 그들과 함께 하든 아니든 그런 사정을 떠나 다만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설가란 결국 어떤 사실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서 그 역할이 끝나는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문열의 소설은 자주 중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의 소설은 여느 소설처럼 하나의 지평에 있지 않다. 하나의 소설에서 자주 두 서너 개의 시선과 관점이 등장한다. 그에게 자주 양비론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까닭이다. 이문열 소설의 이같은 성격은 특히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자주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문열 소설의 특성을 흔히 그의 가족사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그의 박식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저 조선일보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이를테면 '선택은 무지할 때 하기가 더 쉬운 법'이라거나, '무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용감할 수 있다'거나, 세상을 하나의 잣대로 재려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논리가 나오는 맥락은 여기에 있다.
이문열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기에 저 '조야'한 민중문학의 논리에는 애초부터 함께 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단지 조악하다는 이유로 그 진리성이 의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리가 항상 정연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는 언제나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성공하면 충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저 논리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접수해야 할 것인가. 소설 <시인>은 이 문제를 묻고 있다. 그리고 이문열은 당연히 반 세기를 이어 온 힘의 논리를 들어 보수 쪽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문열의 생각이다. 독자의 몫은 따로 남겨져 있다. 독자는 어느 쪽에도 설 수 있다. 이문열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시인>에 담아 군더더기 없이 형상화해놓고 있다.
<시인>은 읽기에 충분히 즐거운 소설이다. 독자의 의식을 적어도 부박하게는 하지 않을 소설이고, 보다는 독자를 어떤 치열함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설이다. 하기에 이 소설을 읽는 일은 즐겁다. <통신보안>
Trackback URL : http://blog.mintong.org/trackback/355
Trackback RSS : http://blog.mintong.org/rss/trackback/355
Trackback ATOM : http://blog.mintong.org/atom/trackback/355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한방블르스 2008/04/03 15:2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이데올르기를 떠나 이문열의 박식함은 <황제를 위하여>를 보았을때 많이 느꼈습니다.
<시인>을 말씀하시니 다시 꺼내 읽어 봐야겠습니다. 글 잘보았습니다.
하민혁 2008/04/03 16:48 편집/삭제 댓글 주소
<황제를 위하여>는 말 그대로 현학이 철철 넘치지요. 근데, 전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구요. 장편으로 개작된 <사람의 아들>이 중편에서의 타이트함과 극적 재미를 잃고 넘 현학적으로 흘러버린 것도 별로였구요. 암튼 <시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소설입니다. 소설적 재미를 갖췄다고나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방블르스 2008/04/03 20:2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말씀처럼 <황제를 위하여>는 작가의 박식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좀 드러나지요. <사람의 아들>도 중편때의 간결함 보다 장편떄에는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민혁 2008/04/04 04:2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역시 책을 읽는 느낌은 사람마다 거의 비슷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문열의 말을 들어보면 독자가 아닌 작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보면.. 많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흠.. 근데.. 댓글을 적다보니 문득.. 이 블로그 컨셉을 그냥 확 책 이야기로 잡고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적어도 머리 아픈 댓글 달 일은 없을지 모르겠다는.. (아~ 지금 생각하니.. 것도 아니겠네요. 옛날 개인홈피에서 책 얘기 하던 중에도 엄청 쌈박질했던 기억이.. 나중에는 이외수까지 들러 이럴 수 있느냐고 한마디 하고 가더라는.. 그래서 걍 접고 말았더라는.. 그러고 보면 문제는 소재가 아니라 내한테 있는 것같다는.. -_ )
너바나나 2008/04/04 13:39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지금은 무쟈게 싫어라 하지만.. 한 때는 즐겨 읽었구만요.
한방블루스님 얘기하신 <황제를 위하여>는 지도 무척 잼나게 봤구요. 고딩때 읽어서리 현학적이였는지 우쨌는지 기억은 아니지만 여튼 푹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나구만요. 이정길이 아마 주연으로 드라마로도 방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구만요. 그래서리 책도 읽어었던가..음
하민혁 2008/04/04 15:35 편집/삭제 댓글 주소
<호모 엑세쿠탄스>인가요? 그거 마지막으로 읽고나서 사실 좀 허탈했댔습니다. 작가에게도 분명한 자기 관점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다고나 할까요. 책을 읽는 내내..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어~ 근데, <황제를 위하여>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나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화면으로 옮겼다지? 거참..
비밀방문자 2009/03/12 12:5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하민혁 2009/03/12 13:31 편집/삭제 댓글 주소
"대신 아주 오래 전에 썼던 (90년대 초에 출판사의 독서 관련 기획물 가운데 하나로 써서 보낸) 글 하나를 옮긴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님의 글을 보고 추가했습니다. 고맙습니다.